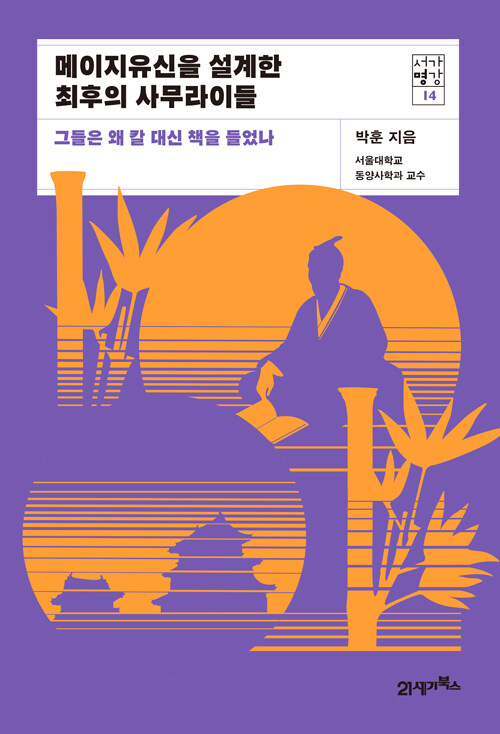막부 말기에서 메이지 유신까지의 역사는 굳이 찾아읽으려고 하지 않아도 일본 소설에서, 드라마에서, 만화나 애니메이션(“바람의 검심”이나 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만나게 된다.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인물들에서 모티브를 따온 듯한 캐릭터들도 많다.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라스트 사무라이”의 모티브가 된 사이고 다카모리라든가. 여기서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오쿠보 도시미치는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오베르슈타인의 조형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일본인들이 두루두루 사랑하는 것은 물론 손정의도 존경한다는 사카모토 료마에게서 영향을 받은 캐릭터는 어디 한둘일까.
보통은 창작물에서 실존인물 모티브 캐릭터들을 접하다 보면 원본에 관심을 갖게되고 해당 시대의 역사에 대해 차곡차곡 지식이 쌓여야 하는데, 이 시기의 실존인물 모티브 캐릭터에게 정을 좀 붙이고 읽다 보면 실존인물이 정한론을 주장했다거나(…..) 심지어는 작중에서 조선을 언급하고 있어서 길게 정을 붙일 수가 없어지더라는 게 문제다. 심지어는 요시나가 후미의 “오오쿠”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에도 무척 긴장했는데, 다행히도 요시나가 후미 선생님은 “여성 쇼군이 다스리던 역사가 지워지는 일본”에 집중하고 민감한 부분을 에둘러 가셨다. 사카모토 료마의 일대기는 흥미진진하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튀어나올 때 마다 집중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책은 그 조각조각난 채 이어붙이지 못하고 있던 에피소드들을 이어붙일 수도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어붙이고 나니 맥락이 생기고, 그동안 읽었던 것들에서 무엇을 다시 보아야 할 지도 생각하게 된다.
흥미로웠던 것은 이 대목인데
메이지 유신 과정에서 농민, 상인이라고 하는 주요 피지배세력은 사무라이층에 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메이지 유신은 지배층인 사무라이층 내부의 다툼과 그 파장으로 일어난 것이고, 그 속에서 급진개혁파가 주도권을 잡아 이뤄낸 변혁이었다. 이런 메이지 유신의 성격은 일본 사회에 보수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다주었다.
왜 일본에서 시민운동이 어려운가, 왜 사람들은 자민당을 그렇게 찍어대고 자민당 안에서 마치 작은 정당처럼 계파가 나뉘고들 있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지역구를 아들이 물려받거나 그런 세습이 가능한가, 심지어는 만화에서도 이 지역 의원인데 3대째,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 배경이 궁금했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 이름으로 출마만 하면 시체도 당선이 되더라는 일화가 있는 나라에서 남의 나라 일을 걱정하는 것도 우습지만) 어쩌면 근대로의 전환점에서 밑에서부터의 개혁, 여기 언급된 요시다 쇼인의 표현대로라면 “초망굴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회 지도층 안에서 대립과 갈등에서 비롯되었던 것이 문제였을지도. 정치란 늘 사회지도층, 특정 세력이 하는 것이고, 시민운동은 그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호응이 적은 것일까. 때때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 덕담이랍시고 “성군이 되시라”고 하거나 스스로는 “백성”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왕의 모가지를 따지 않고 근대로 넘어와서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있는건가.”하고 한탄할 때가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는 동학농민운동이나 독립운동, 더 과거로 가면 의병 등과 같이 피지배층이 무기를 들고 일어난 경험이 있고, 또 전쟁으로 신분제도가 한번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