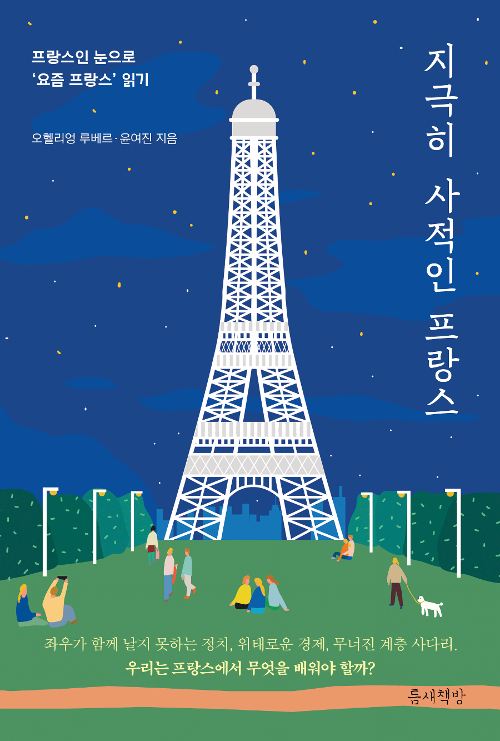귀족 문화의 중심지였던 우아한 도시이자 로베르 두아노의 낭만적인 사진으로 인해 로맨틱한 도시로 여겨지는 파리. 사실 우리가 흔히 프랑스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에는 이원복의 “먼나라 이웃나라”와 홍세화의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에서 온 부분이 크다. 특히 자유와 낭만, 평등한 가정, 똘레랑스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다면. 하지만 오헬리엉 루베르는 프랑스에 대해 딱히 환상을 품을 필요가 없다고, 그곳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전제하며 요즘의 프랑스를, 특히 68혁명 이후 개인주의적인 면이 강화된 프랑스 사람들의 성향과, 그들이 일상에서 즐기는 것들에 대해 중점을 두어 이야기한다.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프랑스의 역사 교육. “프랑스 시민”이 아니라 “시민”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는 이 교육은, 켈트 족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프랑스가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국가, 통합된 민족”을 강조하는 역사 교육이 일종의 민족주의적 세뇌가 아니냐는 반성에서 나왔다. 그리스 민주주의에서 누가 시민이고 누가 배제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에서 시작하여 “유럽의 시민”을 만드는 이 역사 수업 시간에서는 민족주의적 감정 고취가 아닌 “역사적 사실 확인”이 강조된다.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을 두고 사진이나 지도, 자료를 제공받아 직접 분석하는 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유사역사학이나, 시도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민족주의적 오류들이 덜 자리잡을 것 같긴 하다.
저자가 JTBC의 방송 “비정상회담”에서 프랑스 대표로 나와 이야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비정상회담”을 한 차례도 보지 않아서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2009년에 육군사관학교에서 프랑스를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 10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니, 홍세화가 뿌려놓은 “똘레랑스” 이야기는 마르고 닳도록 들었을 것 같아서 어쩐지 딱한 기분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