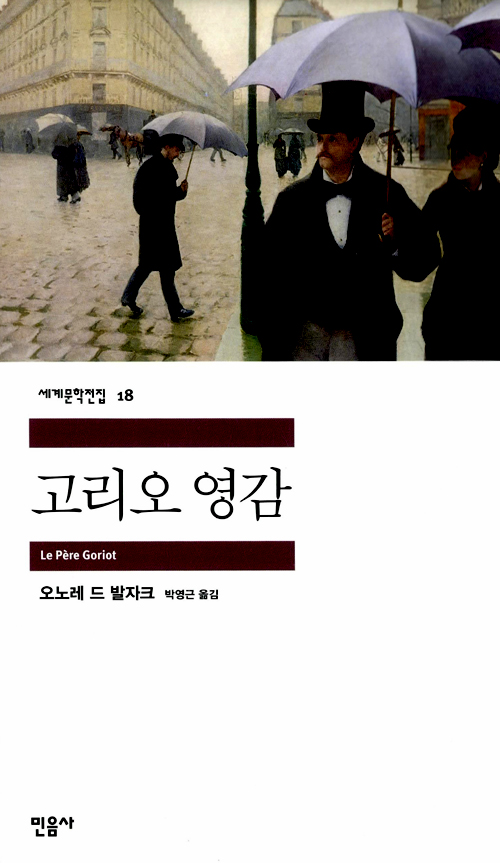파리의 영락한 자들이 모인 싸구려 하숙집에 기거하는 고리오 씨는 고리오 영감이라 천대당하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원래는 부유한 제면업자였다. 사람들은 가끔 그가 만나는 그가 딸이라고 말하는 아름다운 귀부인들을 보고, 그가 난봉생활 끝에 재산을 잃은 자라 생각한다. 한편 같은 하숙집에 기거하는 학생인 외젠 라스티냐크는 시골 귀족의 후손으로 출세를 위해 대학 공부도 등한시하며 사교계를 꿈꾸는데, 사촌 누님사람 중에 대학 공부도 등한시하며 사교계에서의 출세로 신분상승을 꿈꾸는 청년 외젠 라스티냐크는 파리 사교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촌누님 드 보세앙 부인의 도움을 받아, 언젠가 고리오 영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나스타지 드 레스토 부인에게 접근한다. 그러나 그녀는 고리오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그를 박대하고, 보세앙 자작부인은 전말을 설망한다. 그 초라한 하숙집에서도 가장 가난한 생활을 하는 고리오 영감이야말로, 아나스타지 드 레스토 백작부인과 델핀 드 뉘싱겐 남작부인의 아버지라는 것.
딸들에게 털리고 버림받는 아버지라는 점에서, 그는 19세기 버전 리어 왕이나 다름없는데다, 그나마 악인들이 비극적 최후라도 맞이하던 리어 왕과는 또 달리 이쪽은 리얼리즘의 적자나 다름없는 발자크의 작품이다. 글 쓴다고 집을 나와 쫄쫄 굶다 못해 가죽벨트까지 씹어먹었다는 그 발자크에게 그런 자비라든가 권선징악이라든가 하느님의 섭리 같은 것을 기대하면 곤란하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두 딸만을 미친듯 사랑하는 아버지의 돈의 힘으로 지체높은 귀족인 레스토 백작이나 부유한 은행가인 뉘싱겐 남작과 결혼한 그의 두 딸은 아버지를 화려한 사교계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며 빚을 지거나 자신의 정부를 위해 보증을 서거나 하며 사랑을 담보로 아버지의 돈을 끝없이 요구한다. 라스티냐크는 그런 고리오 영감과 두 귀부인의 모습을 보며 고리오 영감은 성자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자신 역시 사교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손을 벌린다. 물론 자신은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그는 고모님이 남편의 유품을 판 돈과, 어머니가 마련한 돈과, 두 누이가 저축한 돈을 받아 사교계에 나서기 위해 필요한 옷가지를 갖춘다. 어머니는 걱정하지만, 누이들은 오라비를 위해 유행에 어울리는 속옷 같은 것을 만들어 보내주겠다고까지 말하며 그를 돕는다. 이들은 고리오의, 딸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희생하다가 파멸하는 모습에 돌림노래처럼 겹쳐지지만 다행히도 이들의 몰락은 소설중에는 나오지 않는다.
사교계 생활을 하며 필요한 돈 때문에 허덕이던 라스티냐크는 보트랭의 유혹에 시달리지만 거절하고, 고리오는 라스티냐크가 자신의 딸 델핀과 가까워졌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자신의 아들이라 부르고, 두 딸들을 데려가고 돈도 제대로 주지 않아 가엾게 만드는 사위들을 협잡군들이라 비난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연금을 정리하여 라스티냐크와 델핀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좋은 옷과 은식기를 갖고 하숙집에 왔던 고리오 영감은 그렇게 딸들을 위하여 가치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 돈을 대어 주었고, 이제 라스티냐크와 델핀의 가까이에 살며 여생을 마칠 꿈을 꾼다. 그러나 아나스타지가 나타나 또다시 돈을 요구하고, 최상류 사교계를 동경했으나 언니가 도와주지 않아 그럴 수 없었던 델핀과 그나마 델핀만큼의 부를 누리지 못한 아나스타지는 그동안의 질투와 원망이 폭발하며 서로 싸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고리오 영감은 아나스타지를 위해 돈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괴로움에 시달리고, 사랑하는 두 딸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다가 쓰러지고 만다. (아나스타지가 필요한 돈은 라스티냐크가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사교생활에 바쁜 두 딸은 아버지가 쓰러졌음에도 병문안도 오지 않으며, 라스티냐크가 노인의 간호를 맡는다. 사기꾼 보트랭이 체포되고 라스티냐크는 방을 뺀 데다 노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숙집 주인은 하숙생이 줄어 침통해한다. 노인의 약값조차 주지 않는 두 귀부인의 사위들을 보며 라스티냐크는 한심해하며 자신의 돈으로 경비를 지불하고, 고리오는 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번갈아 중얼거리다가 라스티냐크와 그 친구를 딸들로 착각한 가운데 숨을 거둔다. 사교계에 지치고 사랑에 상처입은 보세앙 자작부인은 사교계를 떠나고, 고리오가 죽었음에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간다. 라스티냐크는 그의 유해를 공동묘지에 매장하며 사교계에 물들지 않은 청춘으로서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그는 파리와 성공을 향해, 사회로 나서는 첫 걸음처럼 델핀을 찾아간다.
웅웅거리는 벌집 같은 이곳에 그는 미리 꿀을 빨아내기라도 할 듯한 시선을 던지며 이 거창한 말을 던졌다.
‘자, 이제 파리와 나, 우리 둘의 대결이다!.’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첫 도전의 행동으로, 라스티냐크는 뉘싱겐 부인 집에 저녁을 먹으러 갔다.
발자크의 인간 희극 연작 중 하나인 이 이야기는 “인생의 첫 출발”이나 “사촌 베트”등의 다른 작품과 함께 읽으면 비슷한 구도를 엿볼 수 있다. 인간 희극을 다 읽다 보면 라스티냐크나 뉘싱겐 등은 계속 등장한다고 하는데, 인간 희극 연작 중에 셋밖에 안 보았기 때문에 그 설명에 대해서는 딱히 느껴지는 바가 없지만, 발자크 식의 리얼리즘, 물론 최하류 계층이 나오지 않고, 사교계를 통한 신분상승을 꿈꾸는 청년들이 계속 나오는, 적어도 귀족이나 쁘띠 부르주아 이상을 배경으로 한 리얼리즘이라는 시대적 신분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풍자적으로 그려지는 이 리얼리즘은 글을 쓰는 사람이 적어도 한 번은 마주서야 할 거대한 벽이 아닐까. 거장의 소설은, 그래서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다. 넘어설 수 있는가, 마주설 수 있는가. 그런 자문을 계속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