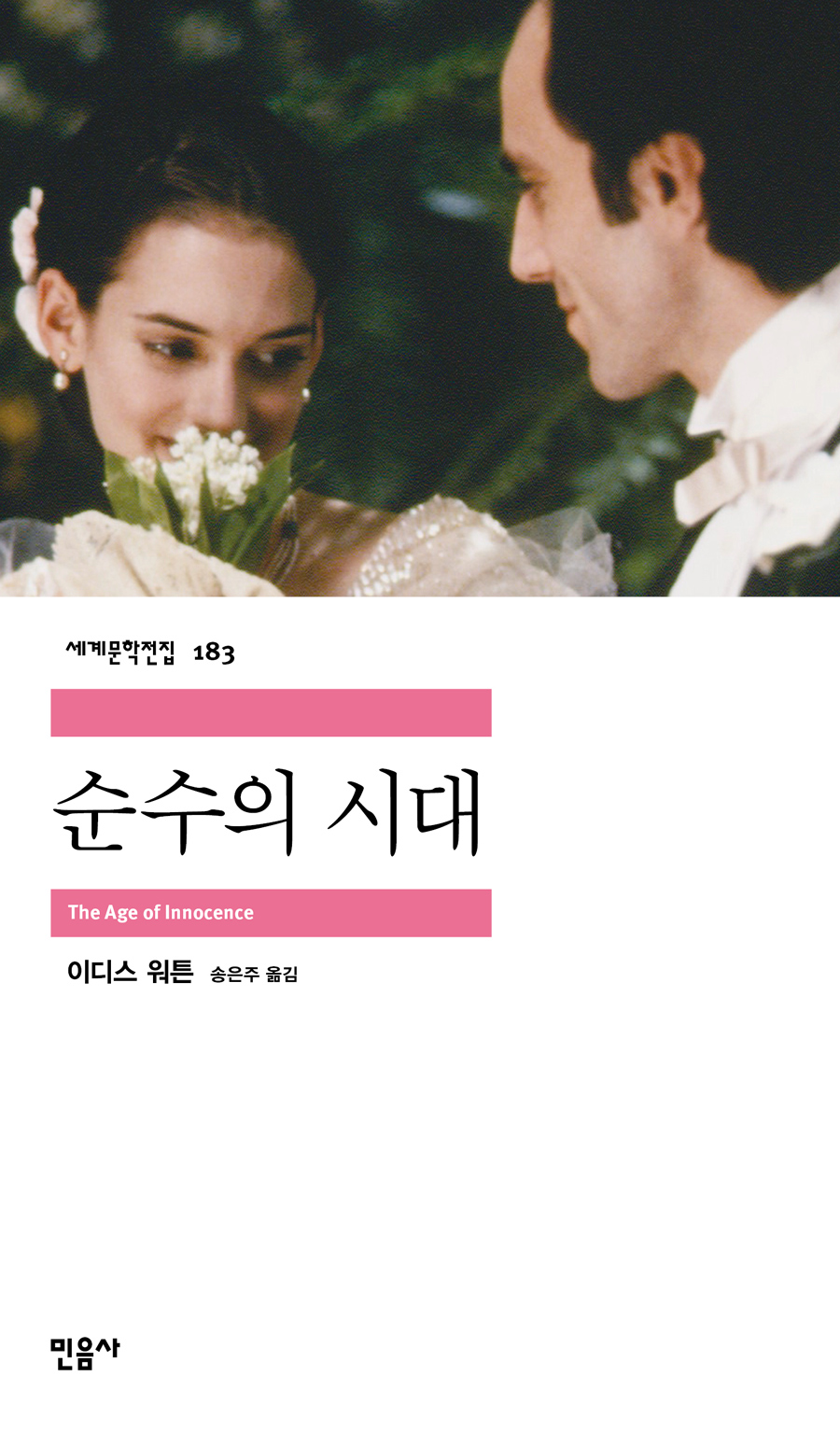1870년대, 뉴욕. 영국에서 독립한 그 나라의 후손들은 어째서인지 영국 귀족들을 동경하고, 이 신대륙의 부호들은 딸을 유럽의 귀족가로 출가시켰으며, 귀족들의 푸른 피를 이어받지 않은 부유층들이 마치 자신들은 태생부터 귀족이고 상류층인 양 극도로 스노비즘을 부려대는 시대. 예절과 법도와 도덕이라는 허상에 가린 기만과 위선이 가득한, 읽는 내내 재수없고 닭살스런 이 배경은 아마도 오리지널을 따라하려다 과잉이 된 어떤 것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이곳의 젊은 신사 뉴랜드가 한없이 순수하고 티없게 생각한 약혼녀, 메이 웰랜드.
그 메이의 친척인 엘렌 올렌스카 부인은, 폴란드 귀족에게 시집갔으나 이혼하고 돌아온, 소위 소문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혹했던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상류 계급 아닌 보통 사람들의 동네에 집을 얻어 살아가며 귀족들이 꺼려하는 보헤미안들과 어울리고 누구에게나 진심어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여성이다. 그녀의 삶의 방식은 이곳의 상류층들에게 있어 규범을 파괴하는 위험 요소다. 그녀는 일종의 “마녀”이며, 순수하지 못한 존재로 여겨진다. 19세기, 오히려 구대륙에서는 조금씩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는 여성이라는 존재가 이 시대의 뉴욕에서는 금기가 되는 것은, 영국 식민지 시절 이미 에드워디안을 지나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음에도 빅토리안 사조가 남아있던 인도 등을 떠올리게 한다. 다시 말해, “그 좋았던 시절”을 동경하며 따라하는 것이 이들의 삶을 평민들과 다른 특별하고 고귀한 어떤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느낌.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오히려 사교계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엘렌에게. 메이의 약혼자인 뉴랜드가 방문한다. 처음에는 곤란에 빠진 친적을 돕기 위해,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자신에게 당당하고 자유로우려 하는 그녀에 대한 호감에.
그런 것을 뉴랜드보다 먼저 알아챈 것은 바로 메이였다. 뉴랜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이 돌보고 이끌어야 하는 존재로 티없고 순수하다 여겼던 여성. 그녀는 결혼을 서두르고 뉴랜드를 붙잡아 놓는다. 그리고 뉴욕의 사교계는 조금씩 뉴랜드와 엘렌의 사이를 죄어들어, 끝내 엘렌을 추방하고 만다. 바로 그 순수한 메이를 주축으로 해서.
그리고 사교계란, 원래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굴러간다.
순수의 시대. 하지만 그 순수란 어쩐지 생동감있게 흘러가는 맑은 물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어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증류수와 같은 느낌이 드는 순수다. 흙탕물을 한두 번 걸러낸게 아니라, 아예 증류하고 박제해버린 듯한. 그리고는 그 기준에 어긋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밀쳐내어 버리지만, 그 증류수는 생명을 키울 수 없는 물. 뉴랜드가 살아가는 그 뉴욕의 사교계 역시, 그런 (원래도 밥맛없지만 과장되기까지 한) 과장된 스노비즘으로 인하여 그저 겉 보기에만 좋은 인형들의 세계와 같다. 엘렌이 사라지고, 빛을 잃은 듯한 그 세계에서. 한 번 그 생명력을 느껴 본 사람이 원래의 삶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역시 분명할 터. 차라리, 그는 메이가 결혼을 서두르는 그 시점에서, 자신도 엘렌에게 끌리고 있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함께 결혼을 서두를 게 아니라 한 박자 쉬며 생각을 해야 했다. 자신을 구할 길은, 그 선택이 결국 메이였건 엘렌이었건 상관없이 그렇게 한 박자 쉬는 것 밖에 없었을 거다. 그 대가로 아마도, 뉴랜드는 남은 인생 전부를 그 퍽퍽한 증류수 속에서 헤엄쳐야만 했을 거다.